우리나라 뮤지컬 팬들도 다회차 열심히 인증하고 그러며 팬심을 자랑하긴 하나, 국경을 넘어 오는 정성은 뮤지컬 업계를 넘어서는 혜택을 우리나라 여러 방면에 두루 준다. 제작사인 EMK 측에서 회견이나 쇼케이스 등을 할 때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기획하는 걸 당연시 하는 형편인 것도 있겠고, 그런 측면에서 고안된 캐스팅과 서비스 플롯의 추가 등등도 이번에 3연을 맞이한 ‘뮤지컬 벤허’에서 꽤 눈여겨 볼 부분이다 싶다.
 |
아무래도 우리가 ‘벤허’라고 하면 찰턴 헤스턴 주연의 1959년 영화를 연상한다. 매년 케이블TV에서 방송되기도 하고, 교회 등지에서 영화 튼다고 그러면 리스트 중에 늘 이름 올리는 게 바로 그 영화다. 다른 버전들이 몇 있기는 하나 국내에서는 인지도도 약하고, 무엇보다 방영되는 일이 없어서 매번 나오고 또 나오는 이 영화의 이미지로 ‘벤허’라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게 익숙한 형편이다. 그런데 이 작품, 원작은 1880년에 나온 소설이다.
성경 내용을 주제로 삼은 복음소설 류로, 당대 인기 좋았던 모험물로 그리 나온 책이어서 원래의 스토리가 따로 있다. 우리가 영화로 소비해 온 ‘벤허’는 헐리우드 오락영화로 전형적인 마사지가 있었던 형편. 때문에 뮤지컬은 이미지는 영화에서, 이야기는 소설에서 따와 서로 교차하거나 겹치는 그런 형태로 씬과 넘버가 꾸며졌다. 영화만 생각한다면 좀 튄다 싶겠지만, 그런 경우는 소설 내용을 따른 케이스라 상당히 교묘한 서사가 인상적이다.
그리고 교회극을 봤다면 ‘바빌론 유수’와 ‘마사다’ 테마일 경우 곧잘 보이는 루틴이 꽤 녹아든 듯 싶다. 대중 대상 뮤지컬 작품이기에 종교색을 최대한 절제하긴 했으나, 애당초 원작부터가 축성 받은 작품이라 본질은 어디 안가는 상황. 앞서 1연과 2연을 보지 못해 3연 하나만 놓고 본다면, 교회극 관람 경험이 좀 있다면 그 쪽의 스타일이 작품에 내재된 느낌이 어느 정도 든다. 그럼에도 되려, 마무리가 깔끔한 건 소설의 결말 덕분이 아닐까 싶다. 원작도 존중하고 대중오락으로서의 선을 지킨 듯한 딱 그 정도 선에서 멈췄다.
 |
영화의 이미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특별하게 무얼 덧댈 것 까지는 없어 그런 쪽으로는 부담이 덜할 것 같지만, 사실 이 영화의 이미지 때문에 정작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다. 바로 스케일적인 측면이다. 1959년 당시에 CG 없이 진짜 사람들과 짐승들과 미니어처 등등으로 60년 넘게 보는 사람 여전히 압도하는 영상미를 만들어 낸 영화가 또 기억을 살살 긁는다. 때문에, 무대를 꽉 채우고 움직임으로 또 꽉 채우는 그런 형태로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는다. 고증에 따르자면 상당히 현대적인 선택을 한 것이겠지만, 그렇게나마 무대를 역동적으로 만들어 영화에서와 같이 그럴 씬에서는 눈을 부지런하게 만든다.
이처럼 역동성으로 무대를 채우는 과정에서, 상업적인 성공을 목적으로 한 뮤지컬 벤허만의 특질적인 부분이 하나 돌출된다. 뮤지컬 와서 캐스팅 보면 알겠지만, 여성 캐릭터는 단 셋. 앙상블은 노소 따질 것 없이 모두 남성들 뿐이다. 벤허와 메셀라 투 톱으로 뮤지컬 팬덤을 이끄는 것도 있겠지만, 구도 자체가 이렇다 보니 남성미에 취향 있으신 분들에게 서비스의 포커스가 오롯이 다 가 있다. 현대무용을 갈고 닦은 남성 앙상블이 수시로 상의탈의 상태로 꽤 긴 시간 군무와 개인이 나선 쇼타임을 펼치는데다, 벤허와 메셀라도 일 생기면 웃통 벗고 나선다.
 |
물론 특별히 종교에 관해 원리주의적 입장이 아니라면야 즐길 요소는 그 시절 영화나 지금의 뮤지컬이나 출중한 편이다. 무엇보다 ‘넘버’의 가사는 자조적인 흐름을 공감하자면 발라드 따라 부르듯 읊조리기 좋은 그런 ‘노래’들이다. 원작이 너무 비범하고 오랜 기간 생명력이 이어진 탓에 뮤지컬이 그런 이미지에 사로 잡혔다고는 해도, 뮤지컬 나름으로 노래와 씬으로 독자적인 완성도를 갖췄다. 그래서 그런지, 그 멀고 먼 길 해외에서 온 사람들에게도 배우들의 열연을 추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 뮤지컬 그 자체의 내실이 탄탄한 덕분이다 싶다.
Copyright ⓒ Acrofan All Right Reserved.
















 클레이튼 핀시아 통합 체인 카이아(kaia), 라인 넥스트 협업..
클레이튼 핀시아 통합 체인 카이아(kaia), 라인 넥스트 협업..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트 2023에서 AI 미래 여는 혁신 ..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트 2023에서 AI 미래 여는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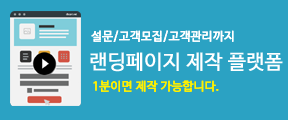
 포르쉐 AG, 하이브리드 드라이브 탑재한 최초..
포르쉐 AG, 하이브리드 드라이브 탑재한 최초.. 벤틀리모터스, 뮬리너 코치빌트 모델 ‘바투르 ..
벤틀리모터스, 뮬리너 코치빌트 모델 ‘바투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