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은, ‘사세구’에 준한다는 게 솔직한 감상이다. 때가 되어 으례 하는 업에서의 은퇴보다는 스스로 죽음을 앞뒀다는 걸 인지하며 쓴 그런 기미가 물씬 풍긴다. 애니메이션의 제목인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도, 원작의 스토리대로 작품을 만들어서 이런 게 아니라,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본인이 어렸을 적 어머니가 권한 책 이름이 이거라서 이리 되었다고 알려진 형편. 주인공인 마키 마히토 역시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선물받은 책 제목이 바로 이 책이고. 보고 눈물 흘리는 것 역시 꼭 애니메이션만의 장치가 아닌 감독 자신의 투영이 짙다.
반 팔십, 반 백... 그리 나이 들면 젊었을 때는 못해보는 경험이란 걸 슬슬 하게 된다. 주변 어르신이나 형님들 세상 뜰 날이 가까워질 때, 술자리든 병석에서든 어렸을 적 어머니 이야기를 새삼 늘어놓기 시작하는 것도 그런 류. 그래서 본작은 작품 그 자체가 아니라, 각본부터 감독까지 모두 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스스로 많은 사람들의 손을 빌려 마음껏 만들 수 있을 때 그러한 자신만의 자전적 이야기요 사세구라는 느낌이 그래서 참 강렬하게 뇌리에 박힌다.
 |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며 만나는 수 많은 사건과 사고들, 그리고 헤어짐과 만남은 가장 작게 자신의 가족만으로도 가장 절실하게 겪게 되는 일들이다. 그리고 우에서 좌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책들 속 글자의 배열은 이게 얼마나 옛 이야기인지를 명확히 상기시킨다. 애당초 트렌디하게 팔릴 작품이라기 보다는, 스스로를 옛날의 옛날 사람으로서 특정하고 시작부터 작정한 때문인 것 같다. 이러면, 마케팅이니 홍보니 할 필요 없기도 하니... 일본 개봉 때 왜 그리 신비주의 흉내였는지 알만하다.
그리고 묘하게 상징성을 비튼 것도 인상적이다. 대표적으로 화장실 옆 펠리컨 씬. 대개 새는 죽음을 상징한다고들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보다는 누구나 품고 있는 욕망의 편린에 가깝다. 욕망의 말로 중 하나가 죽음인 것이지, 욕망 그 자체가 선악으로 딱 나뉘지 않는달까. 잉꼬대왕이 감독이 살며 다소 싫었던 남의 크디큰 목소리들을 상징하는 거 같으나, 그 역시 지나고 보면 한낱 부질 없는 것이었다는 회한 마저 서려 있다. 완장 떼면 갈 날 받아 놓은 기생물에 지나지 않음은 새삼 더 그런 회한을 더해준달까. 새들은 그저 그대로가, 마음이 생각이 하나에 꽂힌 한 가지 루트 정도로 보인다. 뭐에 미쳐 단방향인 삶이면서도 얄밉게도 사실은 서로서로 돕고 걱정하는 그런 관계. 마음 속 수 많은 요소 요소들이 마치 거울처럼 감독 그 자신과 겹쳐져 표현된다. 그 스스로가 가장 싫었을 왜가리 같은 본성이, 사실은 어찌 가까운 듯 아니면 먼 듯 스스로를 지켜준 방어기제였을지도. 이러한 이야기 풀이 방식은 마지막 히미의 선택과도 이어진다. 이미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지만, 그건 그대로의 길을 따름이 그 자체로도 보람 있는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스스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모습은 참으로 우리네 어머니 모습 그대로다. 아마도, 감독 그 스스로가 이미 기억조차 희미해질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 작품을 봉헌하고자 하는 느낌까지 든다.
 |
개봉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본인이 더 정렬적으로 새로운 작품 준비에 매진한다고 전해진다. 아마도, 그 스스로도 마음껏 이 작품을 만들고 보니 무언가 다른 생각이 들었던 거 같다. 이번 생애에 이렇게 해냈다고 자부하면서도, 내세에 원점부터의 새로운 시작으로 기대하기에는 지금 이 때 스스로가 해낼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걸 깨달은 게 아닌가 싶다.
이제는 정말, 우리들 산 사람들 마음보다는 하늘이 그의 작품을 하나 더 하나 더 보고 싶어하는가가 관건인 것 같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참으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성취를 살며 이뤘고, 그 자리에서 떠나갈 마음의 준비를 이리 대작으로 해낼 정도로 다른 사람들의 손을 한없이 빌릴 위치까지 점하고 있다. 이런 성공한 삶이 스스로 마무리까지 준비하는 걸 보며, ‘어찌 살아야 할까’라는 새삼 그러한 생각이 든다.
Copyright ⓒ Acrofan All Right Reserved.
















 클레이튼 핀시아 통합 체인 카이아(kaia), 라인 넥스트 협업..
클레이튼 핀시아 통합 체인 카이아(kaia), 라인 넥스트 협업..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트 2023에서 AI 미래 여는 혁신 ..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트 2023에서 AI 미래 여는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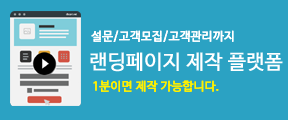
 롤스로이스모터카 : 120년 동안 세상을 변화..
롤스로이스모터카 : 120년 동안 세상을 변화.. 순수 전기 레인지로버, 극한의 글로벌 테스..
순수 전기 레인지로버, 극한의 글로벌 테스..